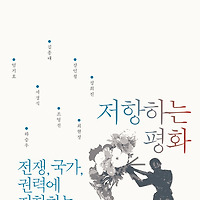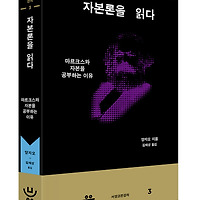김보성, 김향수, 안미선 공저 | 오월의봄 | 2014-11-28 | 13,000원
“요즘에는 몹시 어지러워요. 몸이 그다지 좋지 않아요. 나도 뭐가 힘든지 정확히 표현할 수 없어요. 남편한테 뭐를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남편이 내 맘을 다 이해해주길 바라는 건지, 아니면 내 마음을 모르고 가주기를 바라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지금은 아이들이 우선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버티는 거예요. 애들은 어리고, 내가 안 버티면 무너지니까.
(...)
내가 버티고 버티다가 버틸 수 없게 되면 모든 관계를 끊고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가족관계, 부모 자식 관계 이런 거를 떠나고 싶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자기네가 알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지들이 나한테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난 결혼한 이후로 계속 우울증을 앓았던 거 같아요. 한번은 너무 속상해서 집을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 그냥 울면서 하염없이 걸어 다녔어요, 길거리를. 미친 여자처럼.
남편이 그렇게 참을 수 없는 말을 하면, 내가 더 이상은 미쳐…… 내가 사라져버릴 거야, 아무도 날 못 찾는 데 가서, 아무한테도 연락하지 않고 숨어버릴 거야.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하염없이 길거리를 걸어 다녔어요……(울음)”
-2장 ‘나’와 ‘엄마’ 사이에 가로놓인 산후우울, 인터뷰, 82~84쪽
보도자료에 쓰지 않은 얘기를 조금만 해볼까 한다.
위에 인용한 부분은, 내가 이 책을 만들다가 울어버린 대목이다. 이 책을 외부에 소개할 때, 내가 울었다느니 슬펐다느니 하는 얘기는 하등 쓸모가 없기 때문에(또한 나는 쓸모없이 자주 우는 편이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책은 이 대목에서 보듯 마냥 힘들거나 슬픈 얘기를 담고 있지도 않다. ‘엄마’라는 존재가 사회의 여러 가지 통념과 제약과 시선 속에서 ‘만들어’지고 ‘엄마 노릇’이 때로 강요되기도 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 속에서 우리 젊은 엄마들(20~40대)이 마냥 끌려가고 있다거나 희생당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오히려 엄마들이 이미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완벽한 엄마’라는 환상에 대해서 ‘의미투쟁’을 시작했다고 말한다. 이 책에서는 문제적인 사회현실과 함께 그러한 엄마들의 주체적인 모습도 함께 담고자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을 꼽으라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위 내용을 꼽아야 한다. “그냥 버티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안 버티면 무너지니까”라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느라 한참을 멈춰 있었다. 이것이 이 시대 육아를 하는 엄마들의 처지를 가장 잘, 감상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설명해준다고 느낀다. 그런데 엄마도 우리도 그 ‘버팀’이 기어코 무너졌을 때를 상상하지 않을 수 없다. 인터뷰에 응해준 이 엄마는 그 순간을 상상하면서 겨우겨우 견뎠던 것 같다. 버틸 수 없게 되면 하고 싶은 일이 “모든 관계를 끊고 떠나”는 거란다. 이 여성의 내밀한 고백을 읽으면서, 미친 여자처럼 울며 길거리를 하염없이 걷는 여자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고. ‘(울음)’이라는 기호에서 진짜 흐느낌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이 경우를 비롯한 엄마들의 다양한 우울들이 ‘산후우울증’이라는 손쉬운 용어와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자극적인 소재들(엄마가 우울을 못 견뎌 아이를 해치고 자기도 뛰어내렸다더라, 와 같은)로만 설명되고 소비되는 경향에 대해서, 이 책은 크게 경계하고 있다. 사실 대다수의 엄마들이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다가 애를 해치면 어쩌지’ 하고 스스로 두려워하는데,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것 자체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며, 오히려 그 공포가 당장 현실이 될 것마냥 겁을 주고 그 생각 자체를 금기시하는 것이 더 위험한 일이다.
‘육아’가 사회가 기획하는 거대한 프로젝트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행복하고 눈물겨운 개개인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엄마들의 고통과 우울 그 자체를 ‘그냥 듣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그냥 버티는’ 엄마들의 목소리를 ‘그냥 듣는’ 것조차도 사실은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 사회가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닐까. 우울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말해지지 못하는 우울이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엄마들의 인터뷰에서 종종 ‘(울음)’이라는 글자를 만날 때, 나는 같이 질질 짰지만 동시에 아주 반갑기도 했다.
말하도록 해주기. 울어도 된다고 해주기.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라고 피식 웃게 해주기. 이 책이 그런 일에 보탬이 된다면 정말 좋겠다!!!
'땡땡책 주요활동 > 건강한 출판유통 고민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우리가 팔고 우리가 사는 땡땡서점 (0) | 2019.02.23 |
|---|---|
| 땡땡책 친구출판사를 소개합니다 (0) | 2019.01.11 |
| 땡땡 간담회 - 작은 것들이 모이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0) | 2018.10.16 |
| 어린이 독자를 위한 5월의 책 추천 (0) | 2018.04.30 |
| 땡땡책 친구출판사는 어디? (0) | 2016.05.02 |
| 《저항하는 평화》(오월의봄) 편집자 후기 (1) | 2015.01.18 |
| <자본론을 읽다>(유유) 편집자 후기 (1) | 2014.10.25 |
| "삼평리로 가는 버스에서 이 글을 쓴다"(한티재) (1) | 2014.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