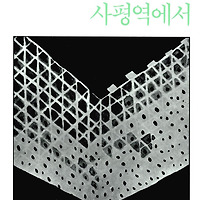고향 같은 소설 속 불편함의 정체
-<신풍근 배커리 약사>를 읽고
용석
아마도 10년 전쯤, 20대 중반에 김소진의 소설을 처음 읽었다. 친구 생일 선물로 박완서의 『자전거 도둑』을 준다는 것이 그만 김소진의 『자전거 도둑』을 사게 되었고 선물로 주기 전에 읽었던 것이다. 내용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련한 느낌 같은 것만 기억나는데 그 뒤로 김소진 소설을 찾아 읽으려 하지 않았던 것으로 봐서 크게 인상 깊지는 않았던 거 같다.
그러다 5년 전쯤, 30대 초반에 우연한 기회로 『장석조네 사람들』을 원작 삼아 만든 연극을 보게 되었고, 책도 찾아 읽었다. 이번에는 확실한 느낌이 왔다. 그래서 『열린 사회와 그 적들』까지 사서 읽게 되었다.
서평쓰기모임에서 선뜻 김소진을 선택한 까닭은 『장석조네 사람들』을 읽을 당시 그 느낌이 아직까지 좋게 남아 있기 때문이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에 읽은 『신풍근 배커리 약사』에서는 예전 그 느낌을 거의 찾지 못했고, 외려 불편한 느낌도 종종 들었다.『신풍근 배커리 약사』를 고른 까닭은, 그냥 제목에 끌려서다, 끌린 이유에 논리 같은 건 없다. 그냥 그 제목이 다른 책 제목보다 먼저 눈에 와서 박혔고 떠나가지 않았다. 어떤 운명적인 만남 같은 거를 기대해서 더더욱 기대감만 높았을지도 모르겠다.
불편함
김소진이라는 작가에 대해 아는 게 없다. 딱 책에 나온 프로필 정도만 알고 있다. 63년에 태어나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했고, 한겨레신문 기자를 5년 동안 하다가 95년부터는 소설에 전념했고 97년 이른 나이로 저세상으로 떠난 사람. 80년대 중후반에 대학을 다녔을 테니, 그 당시 사회 분위기로 어떤 삶을 살았을지 짐작할 따름이다. 서울대를 나오고 신문사에서 기자 생활을 한 남성 지식인. 이번 책을 읽으면서는 그러한 면모가 눈에 많이 들어왔다. 통일된 한반도라는 가상의 미래를 배경으로 쓴 <목마른 뿌리>에서는 어쩔 수 없는 계몽주의가 드러나고, <갈매나무를 찾아서>와 <벌레는 단 과육 속에 깃든다>에서는 화이트칼라 지식 노동자의 삶을 엿볼 수 있는데 시대가 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나는 그다지 감정이입이 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불편한 게 아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김소진이라는 사람이 지식 노동자였고 엘리트였으니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썼으니 말이다. 그리고 사실 지식인으로서 김소진이 풍기는 느낌은 거들먹거리는 나이 많은 남성 지식인들에 비할 바가 아니다. 위선이나 허풍 같은 것들이 눈에 보이진 않았다.
내가 불편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작품 전체적으로 드러나는 남녀의 역할이나 사회적 위치, 혹은 대사에서 드러나는 여성에 대한 깊은 차별 같은 것들이다. 물론 2015년의 시각으로 봐서 그렇다. 당시 사회의 통념이나 생각으로 읽었다면 그렇게 여성 차별적이라고 느끼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혹은 김소진이 계속 살아서 2015년에도 소설을 쓰고 있다면 또 어떤 식으로 썼을지도 모른다. 물론 하나도 변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아무튼 나는 이것이 읽는 내내 불편했는데, 그것은 단지 지금 내가 보기에 김소진의 소설이 여성에 대한 인식과 묘사가 너무 구시대적이라거나 차별적이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한계 같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면에는 오히려 관대하다. 물론 박경리나 박완서 같은 작가의 소설은 예전에도 그러지 않았을 수 있지만,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그게 상식이 아니던 시절의 소설을 비판하려면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 불편함은 그리 단순하지는 않다.
내 불편함은 묘하게도 김소진 소설의 좋았던 점과도 깊게 연관이 되는 것 같다.
고향 같은 소설
『장석조네 사람들』을 처음 읽었을 때 나는 아주 오래 전에 방영한 텔레비전 드라마 ‘한 지붕 세 가족’을 떠올렸다. 물론 책과 드라마는 시대적 배경이 적어도 15년 정도 차이가 나지만, 사람들이 도란도란 모여 이웃을 이루고 사는 동네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나는 고향과도 같은 따뜻함을 느꼈다. 사실 나는 고향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는데, 내 유년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우리 동네 풍경이 주는 느낌이 나에게는 고향의 느낌이 아닌가 생각한다. 포장도 안 된 골목길, 집집마다 좁은 마당에 주황색 빨랫줄이 기다랗게 달려 있고, 골목길에선 아이들이 하루 종일 뛰어놀고, 간간히 싸우다 코피가 터져 우는 아이, 누군가 신기한 것을 가지고 오기라도 하면 우르르 모여들어 구경하는 아이들의 풍경.
『장석조네 사람들』은 나 어릴 적 살던 동네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했다. 따뜻한 감정이 밀려들었다. 『신풍근 배커리 약사』에도 그와 비슷한 느낌을 주는 작품들이 몇 개 있다. 기찻길 옆 조그맣게 형성된 시장 마을이 배경인 <건널목에서>와 무려 45년 전통을 이어가는 만두 찐빵집 주인 신풍근 할아버지의 이야기인 <신풍근 배커리 약사> 같은 작품들에선 『장석조네 사람들』을 읽을 때 느꼈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고 보면 김소진이 자기 어린 시절을 바탕으로 쓴 소설들은 대체로 내게 따뜻한 인상을 남겼고, 어른이 되고 나서 신문사 기자 생활을 비롯해 화이트칼라 노동자로 살아가며 겪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쓴 소설들에는 딱히 공감이 가지 않았다.
김소진의 소설에선 뭔가 내 근원 같은 것을 엿볼 수 있는 것 같다. 시골이 고향이 아닌 사람, 도시지만 아직은 옛날에 가까웠던, 다시 말해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살기 전에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라서 그런 거 같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복잡한 불편함을 다시 이야기해보자면, 내가 아련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 시절 그 풍경은 여성(특히 어머니)의 희생을 필수적으로 동반하고 있었는데,그것은 어쩌면 시대적인 문제,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성운동이나 페미니즘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것은 더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무리 지어 사는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유무형의 노동과 관계가 사실은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고, 내가 아는 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것은 주로 여성의 희생이었다는 데 있다. 이건 장석조네 사람들의 손자 손녀가 페미니즘의 세례를 듬뿍 받고 자란 뒤에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을 것만 같다.
공동체 운동이나 생태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페미니스트들 사이의 긴장감은 과연 태생적인 것일까? 그 긴장감은 끝내 만날 수 없는 평생선 같은 걸까? 이런 질문이 머릿속에 복잡하게 떠다닌다. 내 깜냥으로는 아직 여기에 대해 뭐라 말을 할 수 없다. 내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게 아니라 아직 생각이 없다. 내겐 여전히 따뜻함으로 기억되는 김소진의 소설을, 다른 사람들은, 특히 페미니스트 친구들은 어떻게 읽었을지 무척 궁금하다.
'조합원 연재마당 > 땡땡 서평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서평모임-5월] 브레히트, 《살아남은 자의 슬픔》(미선) (1) | 2015.05.28 |
|---|---|
| [서평모임-5월] 브레히트, 《살아남은 자의 슬픔》(용석) (0) | 2015.05.28 |
| [서평모임-4월의 주제 '10년 전 읽은 책'] 곽재구, 《사평역에서》 (0) | 2015.05.28 |
| [서평모임-4월의 주제 '10년 전 읽은 책'] 송두율, 《미완의 귀향과 그 이후》 (0) | 2015.05.28 |
| [서평모임-3월의 주제 '한국소설'] 공선옥, 《꽃 같은 시절》 (0) | 2015.04.12 |
| [서평모임-3월의 주제 '한국소설'] 황정은, 《파씨의 입문》 (0) | 2015.04.12 |
| [서평모임-3월의 주제 '한국소설'] 김애란, 《침이 고인다》 (0) | 2015.04.12 |
| <국가 없는 사회> 서평 by 유해정 (0) | 2014.11.13 |